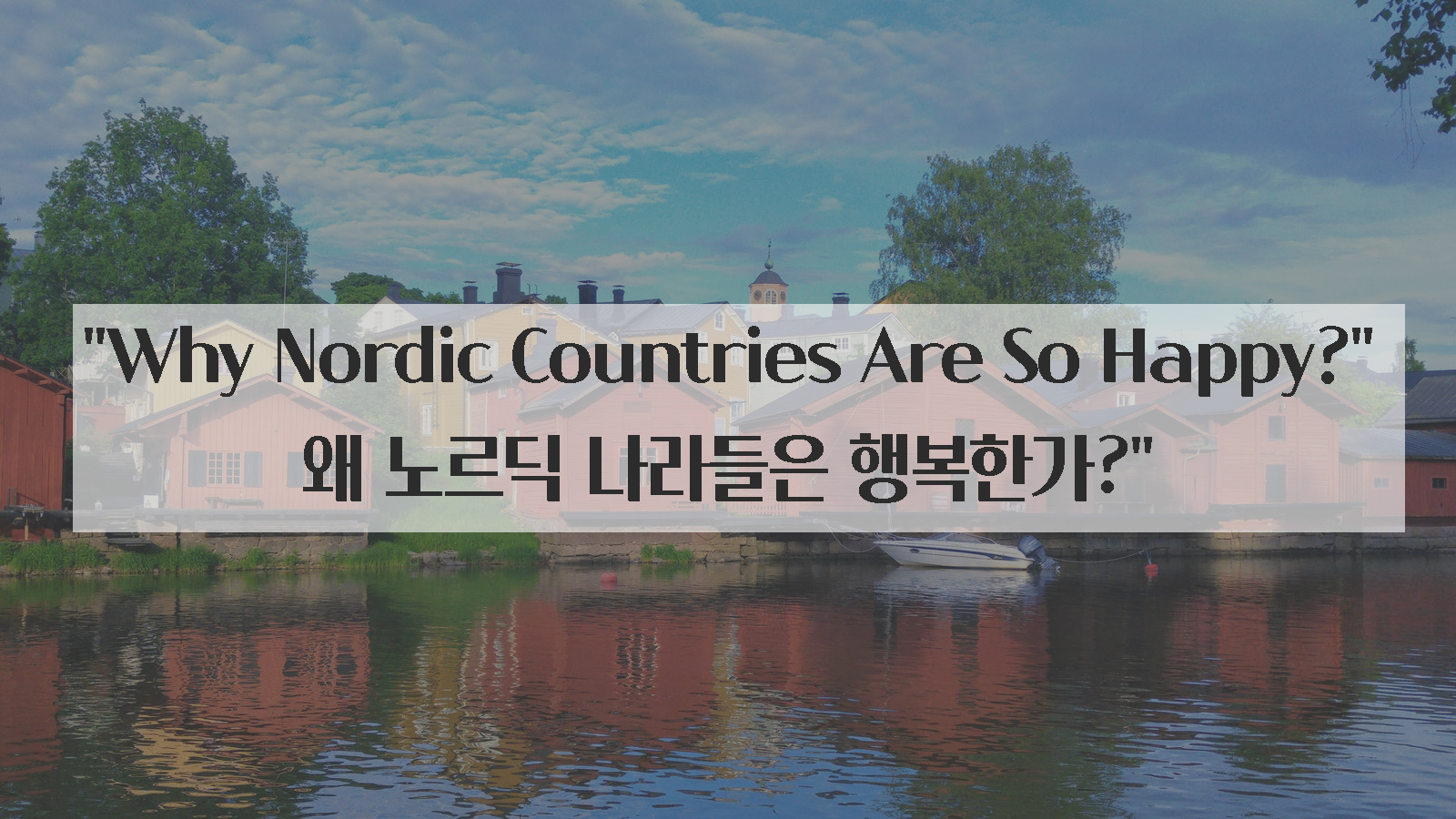
"Why Nordic Countries Are So Happy?"
왜 노르딕 나라들은 행복한가?"
Work-life balance secrets from the happiest countries in the world
Nordic countries are frequently ranked the "happiest in the world." One reason? Their cultures prioritize balance. Here, experts and citizens explain what Americans can learn from Nordic work-life balance.
www.cnbc.com
매년 행복전문가들이 세계 156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조사하여 The World Happiness Report 를 발행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어떤 사람이 사는 삶에대한 만족도"를 가리킨다. "어제 얼마나 웃거나 미소지었는지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노르딕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는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2019년 핀란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트는 각각 2013, 2016년경 1위, 스위스는 2015년경 1위를 기록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노르딕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한다.
"Work-Life Balance"
They don't work long hours.
잡지에 의하면 덴마크의 A full-time workweek (일주일 전시간 근무제)는 5일, 37시간 이다. 의외로 조금 긴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최근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경우 30.2시간이다. 이 기사에서는, 그에 반해, 미국은 44시간으로 하루평균 8.8시간을 일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좀 오래전 자료같고, 2019년 기준 미국은 평균 34.4시간 근무했다고 한다. 한국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힘입어 2010년 45.2시간이었던 때에 비해 지금은 41.5시간으로 떨어지면서 OECD 회원국중 5번째로 긴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일도 중요하지만 삶과 일이 적절하게 발란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유동적 근무시간제 또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핀란드 헬싱키에서 Diplomat(외교관)으로 근무하는 Saara Alhopuro는 일주일 세번 오피스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그녀는 일주일 중 하루정도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 자유시간으로 버섯사진을 찍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핀란드에선 직장인들이 출퇴근시간을 3시간 앞뒤로 조정할 권리가 보장된다.
"Five Weeks Paid Vacation Is A Guarantee"
미국의 경우, 5년경력의 근로자는 평균 15일 정도의 paid vacation 유급휴가를 쓴다. federal paid vacation policy 연방정부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다. 2019년 기준, 23 퍼센트의 미국국민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고, 22%는 공휴일 급여도 없었다. 44%의 미국 근로자들만이 자신의 회사가 연차를 쓰도록 장려한다고 느꼈고, 미국 근로자 55%정도는 유급연차 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반해, 덴마크에선 전시간 근로자는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던지간에 5주의 paid vacation 유급휴가를 준다. 또한, 사람들은 하루 한 시간 정도의 연차를 쓰는데, 늦은 7월,8월에 덴마크나 스웨덴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거의 대부분 휴가를 보내고 있을거라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mokki"라 불리는 cottage (작은 오두막) 같은 데에서 여름을 나는데, 일과 접촉을 차단하고 오직 친구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알려져있다.
"‘Stress leave’ is a Thing"
스트레스 리브 ( sick leave, 라고 하면 보통 아파서 조퇴 하는 걸 말함) 제도가 있는데, 워라벨을 못지켜 스트레스가 발생할때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Stress leave" 기간을 갖고 이 기간동안 월 2,000 달라정도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이 기사에서 새로운 북유럽의 새로운 제도를 알게됐는데 바로 "flexicurity"
"Flexicurity = Flexibility + Security"
'유연 안정성' 이라는 말로 기업에는 해고의 자유를,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정부지원과 재취업의 기회 들의 직접 안정성을 제공하는 노동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노동제도 아래, 고용주는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하거나 새로 고용할 수 있다. 반면, 근로자는 매달 62.54 달라 정도의 보험금을 내야하는데, 이 보험제도를 통해 일을 그만두고나서의 2년동안 보험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해고됐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준다. 예를들어 Konig koehrsen은 painter 가 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학교를 다녔는데, 정부로부터 매달 $1,000의 생활비를 받았다고 한다.
"But Happiness Is Just One Piece Of The Puzzle
하지만 행복은 퍼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Life is not all warm and "hygge."
(hygge-아늑하고 기분족은 상태/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을 중시하는 덴마트와 노르웨이식 상활방식)
노르딕 국가들 대부분 복지가 잘 갖춰있고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문화라고 알려져 있어 살기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만큼 걷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노드딕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덴마트의 경우 25%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히 자동차의 경우 150% 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어마어마한 세금률에도 불구하고 노르딕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불만이 없다고 한다.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만큼 사회적으로 받는 서비스 폭넓게 보장돼있기 때문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건강보험 모두 세금으로 적용되어 부가적인 지출이 소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사회기반이 잘 다지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같다. 현정부가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복지의 구멍이 보인다. 최근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역도선수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한때 역도라는 종목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던 선수가 하반신 마비후 생활고로 고통받다가 죽었다니. 더군다나 그가 받은 연금이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지급수준인 49만 9천 288원보다 3만원 가량 많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의심이 들었다.
'잡다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르딕(Nordic) 이란 (0) | 2020.11.02 |
|---|---|
|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옷 브랜드- Mark Zuckerberg's Clothes (0) | 2019.08.31 |
| 스티브잡스 옷 브랜드 (0) | 2019.07.16 |
| 세계 국가 정보) #1. 대한민국 (0) | 2019.07.13 |
| 한국 수출 품목 1위 (0) | 2019.07.05 |